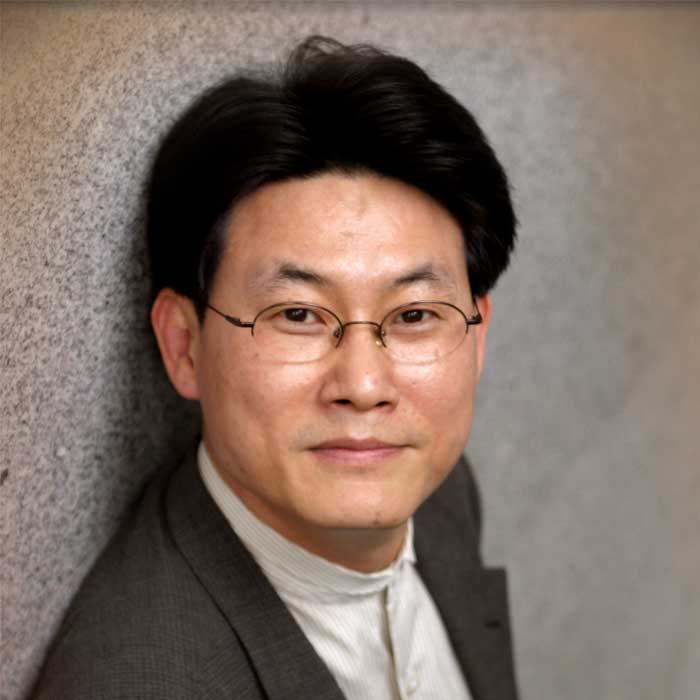
고두현의 아침 시편
우물 속의 달
이규보
산중의 스님이 달빛을 탐하여
호리병 속에 물과 함께 길었네
절에 들어가면 깨닫게 될 것
병 기울여도 그 속에 달이 없다는 것을
詠井中月
山僧貪月色,
幷汲一甁中.
到寺方應覺,
甁傾月亦空.

고려 명문장가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시입니다.
그의 시풍은 당대 최고로 평가됐는데,
몽골군의 침입을 진정표(陳情表)로 격퇴해 더욱 유명해졌죠.
청풍명월은 임자가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취해도 탓할 사람이 없지요.
산중의 바람이나 달은 다른 곳보다 더 맑고 밝으니 스님의 차지도 그만큼 풍족할 것입니다.
굳이 탐했다고 할 나위도 없겠네요.
그런데 스님이 우물 속에 금빛으로 넘실거리는 달빛을 병 속에 물과 함께 길었다고 했습니다.
부질없는 짓이었죠.
달빛은 절 처마 밑으로만 들어가도 비치지 않고,
병 속의 물을 다 기울여도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색(色)일 뿐이지요.
하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에도 ‘색’과 ‘공’이 함께 나오지요.
1구(山僧貪月色)의 마지막 글자인 ‘색’과 4구(甁傾月亦空)의 마지막 글자인 ‘공’이 색즉시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가만히 보면 ‘색’이고 ‘공’입니다.
어떤 모습을 드러내며 살더라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이규보는 평소에 시·술·거문고를 좋아해서 ‘삼혹호 선생’(三酷好先生)으로 불렸습니다.
워낙 술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겨 과거시험에는 관심도 없고 시회(詩會)에 드나드는 것에 열중해서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사마시(司馬試)에 세 번이나 낙방했지요.
자신의 호를 백운거사(白雲居士)로 바꿀 정도로 구름 속에 묻혀 있는 처지에 만족해했습니다.
산승의 작은 욕심에 빗대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시는 일종의 ‘선시(禪詩)’입니다.
만년에 불교에 귀의할 정도로 선(禪)에 관심이 많았던 이규보는 스님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시로 표현하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선종(禪宗)에서 강조하는 것이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지요.
탐하면 병이 되고,
생각이나 어떤 틀에 얽매인다는 것 자체가 집착이라는 얘깁니다.
이규보는 22세에 장원으로 사마시에 합격한 뒤 23세에 예부시에 동진사로 급제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등급으로 합격하자 사퇴하려 했지만,
부친의 만류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과거급제를 축하하는 잔치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급제한 과거는 낮으나 어찌 서너 번쯤 과거의 고열관이 되어 문하생을 배출하지 못하랴.”당장의 처지가 아쉬워도 비굴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 일화죠.
그렇지만 그의 벼슬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렵게 과거에 합격해도 8년 동안 보직이 없었고,
30대가 되어서야 관직에 나아갔지만 부정한 일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모함을 받게 되자 사직하고 말았습니다.
평탄치 않은 삶에 비해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그는 인생의 덧없음과 색즉시공의 원리를 더 빨리 체득했지요.
물질적인 부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결국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인데 그것에 집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집착의 끝이 공(空)임을 깨닫게 되면
눈앞의 욕심으로 그르칠 일도 없겠지요.
■ 고두현 시인 :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시집 『늦게 온 소포』,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달의 뒷면을 보다』 등 출간. 유심작품상,
김만중문학상,
시와시학 젊은시인상 등 수상.
